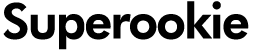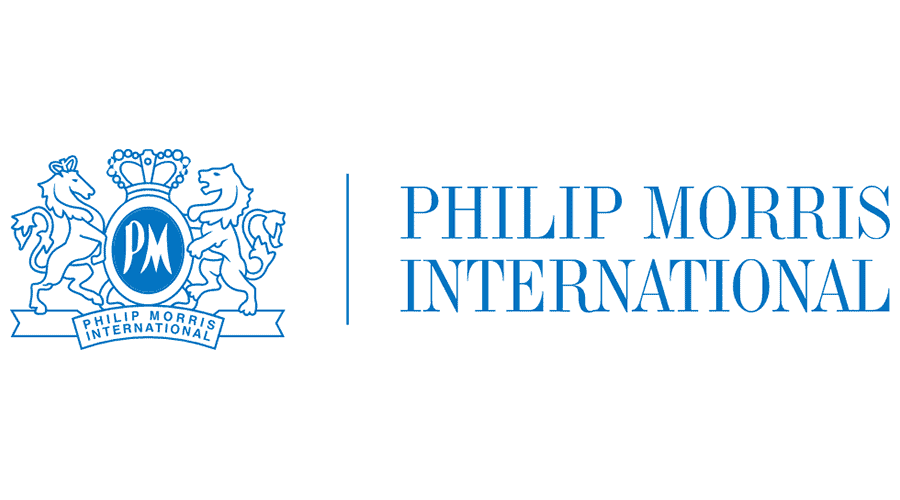항상 그렇게 생각했었다.
그래서 나는 쉽사리 나 자신을 믿지 못했다.
선택의 순간에 맞닥뜨릴 때면, 결국 기존의 삶에 굴복하고 말았다. 그렇게 떠밀리듯 모호한 삶을 지속하다 이제야 좀 여유가 생겨 더 늦기 전에 도전이라도 해보자는 소박한 다짐을 하게 되었다. 나는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조금은 편하게 인정하기로 했다. 정확하게 무엇이 다른지는 모르겠다. 다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대다수의 그것에 반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나는 이러한 감성이 불안하기만 했다. 그래서 애써 그들 무리에 편입되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이곤 했었는데, 내려놓기 시작한 이후로는 이상하게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아니겠는가. 다양성 영화와 힙합, 인문학 책과 삶의 의미와 같은 것들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를, 나는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다.
소박한 다짐 속에는 작가의 꿈도 존재하고 있다. 나는 여태 단 한 번도 ‘나는 글쓰기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라고 스스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것보다는 마냥 ‘쓰는 행위’ 자체가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내 글을 읽는 누군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딱히 동요하지 않았다. 그 사람이 어떤 평을 하던 나는 계속 글을 쓸 참이기에, 심지어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도 개의치 않았다.
사실, ‘작가’라는 포지션에 관심이 생긴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되고 싶고, 하고 싶은 것에는 별 다른 이유가 없다. 이 단어가 주는 어감과 연상되는 분위기가 그냥 좋으니까, 그래서 나는 되어야겠다는, 그래야만 비로소 행복함을 느낄 수 있겠구나 싶었다. 지금도 초심은 바뀌지 않았다. 여전히 나는 잘 쓰는 사람이라기 보단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일 뿐이고, 내 글을 누가 읽던 신경 쓰지 않는다. 대신 공감해주는, 좋았다고 말해주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도대체 왜 책을 내고 싶은 건지를 묻는다면, 간단하다. 꿈이기 때문이다. 무명배우들이 고달픈 생활을 반복하면서도 연극무대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 이리라 생각한다. 타이핑 소리가 주는 리듬감과 한 장 한 장 쌓여갈 때의 희열, 그리고 조용한 독백으로 썼던 글을 읽어나갈 때의 깨달음들이, 정말로 그것들이 나를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나는 이 글들이 하나의 ‘책’이 되어 그 말끔한 표지 디자인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빼앗아버리길 진정으로 바란다. 소수든, 다수든 알지 못하는 누군가와 정신적 교감을 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흔들리는 우리들은 도전해야만 한다. 진부하겠지만, 나는 마음을 다하여 재능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 말하고 싶다. 사실은 누구나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 다만, 그 재능이 빛을 발하는 데 까지 걸리는 시간과 고통을 담대히 견디어 낼 수 있는지. 혹여 견디어 낸다면, 그때는 ‘도전’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재능과 그것보다 위대한 노력과,
다시 그것보다 아름다운 ‘우리들’의 삶과 조우하는 진실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아마도 꿈은 그쯤에서 이뤄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진구 작가님의 더 많은 글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