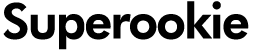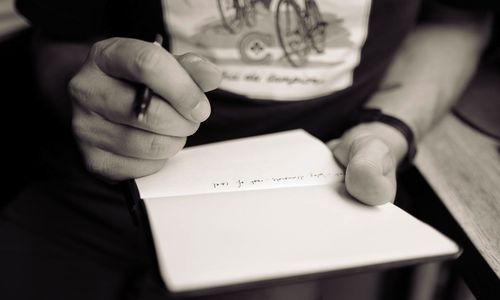성인이 되기 전 까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알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우리 가족이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
청춘으로서의 개성과 주체성이 발현되기 시작하는 스무 살 즈음부터, 나는 ‘차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체감하게 되었다.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외면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시기에 꾸밈과 치장은 청춘들의 특권이자 소소한 행복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 가는 과도기에 가까운 친구들과의 불편한 간극을 인정하기란 쉽지 않았다.
한 번은, 약속 장소에서 친구가 ATM기로 현금 인출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내심 궁금한 마음에 기기의 화면으로 눈을 돌렸는데, 얼핏 보아도 백 만원 이상 되어 보이는 계좌 잔액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때, 나는 적잖이 충격을 받았었다. 심지어 그 친구는 아르바이트를 한 적도 없었다. 그런데도 이제 갓 스무 살을 넘긴 학생이 그렇게나 많은 용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놀랍고 부러웠다. 반대로, 나는 당장 내일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를 반복적으로 계산하며 오늘의 술자리를 ‘저렴한 곳’으로 낙점하기 위해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고 있었다.
이후로도, 나는 종종 친구들과 ‘수저 색깔이 다름’을 느꼈다. 처음에는 바보같이 부러워만 했다. 그래서 단순히 ‘동급’으로 보이고 싶었다. 한 푼 두 푼 어렵게 모은 용돈이나 아르바이트 월급을 값 비싼 옷과 신발을 사는데 쓰고, 주말마다 당연하다는 듯 유흥을 즐겼다. 당시에는,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모든 즐거움과 쾌락을 느껴보는 것이라 자기 합리화를 하곤 했다.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나는 나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그리도 애를 썼던 것 같다. 다른 이유는 없었다. 단지, 우리 가족이 ‘못 사는 것’같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참 바보 같고 한심한 나의 과거다. 물질에 현혹되는 것이 가장 부질없음을 알면서도 스무 살의 나는 결국 비틀린 내면으로 나의 외면을 꾸미고 또 치장하려 했던 것이다.
누구나 그런 때가 있을 것이다. 마치 나에게만 불필요한 결핍이 발생한 것만 같은. 그것들은 종종 ‘무거운 현실’로 치환되어 개인의 정체성을 흩트려놓곤 한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어찌하여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순간 조금은 마음이 편안해진다. 곧이어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와 같은 고민들에 이르기 시작한다. 이 단계까지 도달했다면, 우리는 이미 가장 큰 고비를 한 번 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잘 사는 것과 못 사는 것은 절대적이고 물리적인 척도가 아니다. 두 가지 그룹의 경계는 상대적이며, 우리가 혹은 우리의 가족이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는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는 확신이 든다면, 그것은 곧 당신의 내면이 가득 차고 있음을 의미하는 바일 것이다.
진구 작가님의 더 많은 글 '보러가기'
진구작가님의 이메일 주소: nazzang49@naver.com